동아음악콩쿨 본선 연주회를 다녀와서 ...

2004-10-17 02:28
14,108
0
본문
며칠 전에 신문에서 동아음악콩쿨 본선연주회 기사를 보고 "아,그래. 이거야!" 무릎을 쳤습니다.
마침 샤갈전을 보려고 하루 외출할 생각이었는데 낮에 보고 전시는 저녁 9시 까지니까 딱! 좋았습니다.
거기다 비올라와 콘트라바스를 전후반으로 같은 날에 하는 게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이었고 보통 무료라고 아는데 유료로 거의 우승초청기념 연주회만 보다 제가 다 떨리고 무척 흥미진진했습니다.
3-4명의 진출자 전원이 같은 곡을 연주하는데 2층에서 심사위원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주시하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쓸쓸히 돌아서는 연주자가 참 슬퍼보이는 연주회였습니다.
순전히 귀한 콘트라베이스 때문에 갔지만 비올라 심사곡도 늘 카페에서 들어왔던 힌데미트의 Der Schwanendreher.
좀처럼 쉬운 곡은 아니지만 듣다보니 까다로운것도 친근해지더군요.
집에서 이것저것 단속하고 좀 늦게 도착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2명의 연주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갖는 중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낯이 익은 비올라 카페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늘 카페에서 연주하던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이 본선에 진출해서 아쉽게도 연주를 마친 상태여서 들을 순 없었지만 무척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곧이어 3번째 연주자의 곡을 듣기 위해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남은 연주자들은 서울대음대 동문 선후배로 졸업생과 2학년 재학생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선지 그 독특한 음색이 참~ 좋았습니다.
별로 긴장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고 차분하게 졸업생 다운 경험과 경륜이 무시 못하는 걸 그 다음 출연자를 보고 내 귀가 틀린게 아닌걸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곡이여서 비교가 쉬웠고 그게 좋은 건지 잘못된 건지 정확친 않았지만 그 음색만으로 제가 갖어야 할 부담은 아니었기에 그냥 좋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희비가 교차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늘함 조차 감상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우연하게도 3번째 출연자부터 본 연주가 1등의 영광을 안았고 2등은 수상자가 없었고 3등은 바로 다음에 연주한 같은 학교 동문인 재학생이 받았습니다.
카페 식구들은 무척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해 저도 당장 어떤 위로의 말을 건낼지 난감했습니다.
그 순간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곁에 있는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곧 시작할 콘트라베이스 진출자의 연주를 들어야했고 그들은 따뜻한 그 무언가가 필요했기에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착찹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빨리 잊는 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심사위원 중에 위찬주 교수님이(비올라) 계신 걸 로비에서 뵙고 알았는데 물론 혼자 좋았지만 반갑더군요.
콘트라베이스 부분.
무대가 갑자기 꽉~ 차는 악기가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 ^^
그런데 위치 잡고 미끄럼을 방지를 위해 의자와 악기를 서로 끈으로 연결하는 등 연주 외에 시작 전과 후가 한참 걸려 모든게 생소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연주자는 무척 떨고 있을까,
굳이 말 안해도 알겠더군요.
첫번 째 연주자가 늘 그렇듯 더 긴장하기 마련인데 감기기운이 있는지 아니면 컨디션이 나쁜지 몸도 많이 굳어보이고 날도 추워 이래저래 떨렸습니다.
본선 연주회에서 순서가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아마도 제비뽑기 하겠죠???
그래도 어쩐지 여학생의 베이스 연주가 한결 부드럽고 풍만해보였습니다.
이화여대 3학년 재학생이었는데 연주곡을 듣는 순간
"너무~ 좋다!"
이 곡을 3번 더 들을 수 있다니 ...
"야호!"
매끄럽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무척 착실하고 풋풋하고 가식없이 다가오더군요.
두번 째 연주자는(한양대 1년) 악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훨신 안정감있게 연주해서 상대적으로 더 좋게 들렸습니다.
악기가 남학생에 비해 참 애교스러웠는데 자잘하게 새긴 꽃무늬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특별히 바로크 느낌이 크기를 초월하더군요.
평소 귀한 악기고 자주 볼 기회가 없어선지 악기만 봐도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베이스도 자꾸 보니까 무감각해지더군요.
비올라가 나중엔 바이올린 처럼 보이듯이..
3악장 뿐이라서 너무 아쉽고 깊어가는 가을 밤이 그렇게 무르익었습니다.
가을과 닿아있는 이곡 다시 듣고 싶습니다.
"D. Dragonetti: Concert in A Major."
연주 외에 활을 악기에 끼고 이동하거나 다른 악기는 직접 가지고 다니는 반면 베이스는 활을 넣은 케이스만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 심지어 심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띠더군요.
의자 역시 전용의자가 따로 있는지 보통 무대에서 쓰는 살짝 걸치기만 하는 의자와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진찰 받을 때 환자가 앉는 검정색 동그란 모양의 회전의자에 높낮이가 가능한 두 종류가 보였습니다.
드디어 3번째 연주자 (Frankfurt 국립음학원4학년) 갑자기 분위기를 걷어내는 아늑한 느낌 보통 심사니까 무대 정면에서 연주하는데 반해 피아노반주 옆에서 한결 포용력 있게 감싸는 베이스가 마치 째즈 연주를 방불케하는 움직임이어서 그제야 연주회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한결 여유롭고 그동안 연주들에 비해 약간 능청스럽다고 해야하나 편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무대를 쓰는 정도나 악기에 대한 두려움도 잊고 마치 혼연일체가 되어 풍부한 저음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3악장은 어려운지 어쩔수 없이 잠시 엉기는 듯 보였지만 애써 여유로움을 유지하려는 듯 그사이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대신 말해주더군요.
감상하기에 최상의 연주여서 나중에 콩쿨 우승곡으로 다시듣고 싶었습니다.
이날 음악감상은 그전과 다른 색다른 맛을 전해주었는데
내심 1등을 기대했습니다.
그 몇 분을 기다리기 지루할 것 같아 전화로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몇 시간 같이 있었다고 쉽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안되더군요.
비올라와 다르게 심사위원이 많았는데 몇 분뒤 6명 가량의 심사위원들이 내려오고 잠시 진출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 누군가 벽에 순위가 매겨진 종이를 붙였습니다.
잠시 술렁거리더니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3번째 연주자가 붙은 종이를 구겨서 휴지통에 집어넣었습니다.
헉!
대번에 무척 자존심이 상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1등은 없고 두번째 연주자와(한양대 1년) 나란히 공동 2위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 같았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궁금해서라도 정중히 묻고 싶었을텐데 ..
저는 채점을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해서 응원온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모아진 점수가 책정된 등수에 미달되면 해당 등수가 없을 수도 있고 공동우승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복잡해 그냥 다음날 전화로 물을 걸 괜히 기분만 상했나, 다 좋았는데 경쟁이 다 망치는구나, 그 짧은 시간에 별 생각을 다했습니다.
그날 샤갈전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한꺼번에 도둑은 기분 추스리기 힘들었을텐데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다면 모를까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샤갈전은 10월 22일까지 연장한다는데 아직 안 다녀오신분들은 물론,
전 샌드위치와 커피 싸들고 미술관으로 하루 소풍 갈 생각입니다.
이번엔 식구들 말고 혼자.
지난번 샤갈책도 다 팔리고 없어 주문만 하고 왔더니 아무래도 아쉽고 이번엔 전시한 책도 좀 느긋하게 돌아보고 그림과 그 외 다른것들도 찾아볼 생각입니다.
슬픔이나 아픔을 모르는 화가 샤갈.
자신을 사로잡는 희망과 기쁨을 또렷하게 그리는 그는
"그림은 나에게 창문" 이라고 했던말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콘트라베이스 다녀와서 1f.m프란티섹 포스챠(contabass)
다시듣기 하니까 또 기분이 다르네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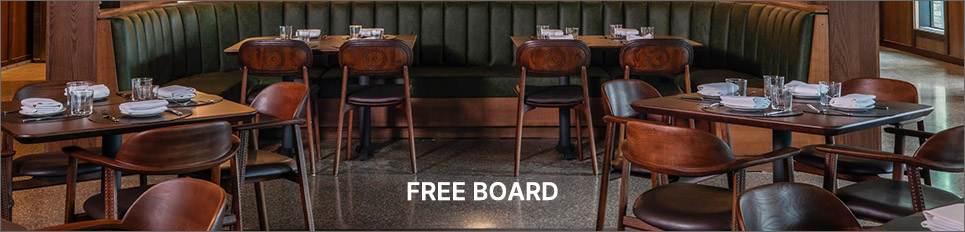
댓글목록0